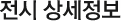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은 올해 덕수궁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전으로 <20세기로의 여행 : 피카소에서 백남준으로>전을 개최한다. 전시 제목이 말해주듯이 20세기 미술의 역사를 고스란히 여행하듯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스테델릭미술관의 소장품 71점과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42점으로 꾸며진다. 총 113점의 전시작품으로 지나치리만큼 다양했던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물론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추상’, ‘표현’, ‘개념’이라는 느슨한 범주에 따라 유파와 장르를 넘나들며 전시되는 이 작품들을 둘러보고 나면, 난해하다고만 생각했던 ‘현대미술’이 실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된다.
피카소가 1924년 테이블 위에 놓인 기타를 그리면서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대상의 조합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작품은 이해할 수 없는 천재의 광기였다. 1906년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블라맹크가 캔버스 위에 강렬한 원색으로 처바른 풍경화는 ‘야수’ 같은 폭발적 표현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대상의 재현을 중요시했던 전통 화가들에게는 경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00여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이들의 작품은 이미 전혀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고전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작가가 만든 작품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이 전시에서는 피카소Picasso와 이불Lee Bul이, 블라맹크Vlaminck와 더글라스 고든Douglas Gordon이 동등한 목소리를 내며 전시장을 차지한다. 좀 더 상투적으로 말해, 80억원 보험가액의 작품과 800만원 보험가액의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고른 질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시회를 위해 함께 걸려진다. 서양미술사의 거대한 흐름에 한국미술가들의 작품이 끼어들면서, 21세기 우리가 맞이한 ‘혼성 문화’의 양상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혁명’, ‘아방가르드’와 같은, ‘현대미술’을 따라다니는 그 거창한 수식어들이, 다시 고전이 되고 또 다른 혁명과 만나는 지점 지점들을 확인함으로써, 지금껏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었던 ‘현대미술’의 진수를 경험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전시는 2008년 재개관을 앞두고 확장공사 중인 스테델릭미술관의 소장품 세계 순회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상하이, 싱가포르, 상파울로, 리오 데 자네이로를 거쳐 종료된 순회일정이, 이번 한국전을 위해 다시 꾸려졌고, 한국 작품을 대거 포함한 새로운 개념으로, 양쪽 미술관 큐레이터들에 의해 공동으로 재기획되었다.
전시 내용 및 구성
20세기 내내 시각예술은 끊임없는 개념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해왔다. 소위 ‘모더니즘modernism’이라는 용어는 전통미술의 반의어가 되었고, 피카소나 브라크가 보여준 시각적 혁명은 서양의 기존미술사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방가르드 자체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모더니즘의 가치기준은 많은 젊은 작가에게 다시금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전에 전위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새로운 도그마로 군림하면서, 젊은 작가들에게 모더니즘은 해체의 대상이 되고 아이러니의 수단이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담론이 유행하면서 모더니즘 담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00년간 전개되어 온 서구중심 미술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흐름들을 113점의 작품으로 설명하려는 이 전시의 시도는 물론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다. 하지만, ‘추상’, ‘표현’, ‘개념’이라는 서로 연관된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구성된 이 전시는, 20세기 미술을 고철하고 정리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를 재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다. 젊은 작가의 작품들이 그 전 세대의 작품들과 나란히 혹은 마주보고 전시되고, 서구의 ‘주류’ 미술가들의 작품 옆에 한국 젊은 작가의 작품들이 놓인다. 각각의 개별 작품들은, 작품 자체의 완벽함과 자율성을 절대시하기보다, 서로 연관하고 소통하며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이로써 이미 전시 자체가 ‘모더니즘’의 도그마를 벗어나려는 하나의 실험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회화, 조각, 설치,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함께 전시되어, 관객의 새롭고 다양한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역사는 매시간 우리들에 의해 새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PART I : 추상 Abstraction
르네상스 이래 삼차원의 공간을 이차원적 회화평면 위에 ‘실감나게’ 표현하려던 철저한 과학적 욕구가 종말을 고한다.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사진’과는 경쟁도 안될만큼 ‘재현력’이 뒤떨어지는 회화는, 이제 있을법한 ‘재현’에 목숨걸기를 그만두고, 좀더 근원적인 실제에 매달리게 된다.
나무 가지의 얽히고설킨 불규칙한 모양도 지극히 단순한 직선과 곡선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몬드리안, 음악과 신지학, 정신적인 세계가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들만으로 ‘그려’질 수 있다고 믿었던 칸딘스키, 대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고정된 시각도 쓸데없다고 냉소할 수 있었던 피카소, 물감 덩어리를 바닥에 뿌리고 흘리는 행위만으로 미국의 자유를 상징했던 잭슨 폴락 등. 그들의 믿음이 20세기 미술에 있어 ‘추상’의 탄생과 유행을 가져왔다. 회화가 더 이상 ‘보이는 것의 재현’이기를 넘어서자,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반응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PART II : 표현 Expressionism
원래 ‘Impressionism(인상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생겨난 ‘Expressionism(표현주의)’은, 객관적인 사물의 관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 행동, 의미, 소리를 작품에 담아내려 했다.
반 고흐의 영향으로 독학의 예술가 길을 선택한 블라맹크처럼 ‘야수같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채와 붓질을 마음껏 구사했던 작가나, 2차대전 후 형식주의 미학에 반기를 들며, “회화는 단순히 색과 선의 구성물이 아니다. 그것은 야수, 밤, 비명, 인간이며, 그 모든 것이다.”라고 외쳤던 코브라 그룹의 작가들, 촌스러운 색채와 빠른 붓질로 추상인 듯 구상인 듯 여인의 이미지를 반복해 그렸던 윌럼 드 쿠닝, 그리고 로스코, 거스톤 등 뉴욕 추상표현주의자들,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면서 회화의 회화성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독일 신표현주의자들(바젤리츠, 뤼페르츠). 이들의 이름 앞에 ‘표현’이라는 단어를 덧댄다. 이들에게 회화는 언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차적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를 ‘표현’하는 매개물이다.
-PART III : 개념 Conceptual Invention
20세기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대단한 소란을 일으켰던 한 명의 작가를 꼽으라면 마르셀 뒤샹이 아닐까? 1917년 ‘R. Mutt’라는 사인을 한 소변기를 버젓이 유명한 전시회장에 갖다놓을 줄 안 뒤샹은, 그 가볍디 가벼운 유머로 기존 예술의 의미, 기능, 역할의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무엇보다 이제 예술은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하는 우아한 형식을 찾아내는 작업이 더 이상 아니다. 예술의 형식과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며, 현대 사회를 직시하고 표상하고 조롱하는 ‘개념’이다.
추상’이 성취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이 새로운 예술적 자유는, 1960년대 미국 팝아트의 엉터리같은 상품광고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심각함과 아이러니가 묘하게 중첩되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도, 브루스 나우먼의 편집증적 극한이나 길버트 앤 조지의 우수에 찬 유머도 모두 예술의 범주로 들여놓았다. 또한 새로 개업한 가게 앞에 놓이는 헬륨풍선 같은 거대한 꽃(최정화의 작품)이 덕수궁미술관의 석조전 계단 앞에 놓이는 것도, 무한히 증식할 것 같은 기계-식물 이미지(이불의 작품)가 대롱대롱 천정에 매달리는 것도 모두 모두 가능해졌다.
의의 및 기대효과 : CLASSIC & ADVENTUROUS
서양미술사의 흐름, 다양한 유파, 이름난 작가들을 대부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한편으로 매우 ‘클래식classic'한 서양미술사의 서술이다. 서양 현대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전시는 최상의 ’현대미술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전시는 결코 ‘재미없는’ 교과서가 아니다. 예술작품은 결코 교조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제작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더구나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여러 갈래의 작품들을 공존시키고, 서구의 규범과 탈출구, 한국의 역사와 상생에 대해 말거는 이 전시는, 하나의 ‘모험적adventurous'인 시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모험적 실험이 ’자유롭고 참여적인 관객의 반응‘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FAMILY SITE
copyright © 2012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이 페이지는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This page provided by Seoul Art Guide.
다음 브라우져 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This page optimized for these browsers. over IE 8, Chrome, FireFox, Safari